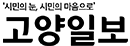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고양일보] 어머니는 애창곡인 백설희 님의 ‘봄날은 간다’를 술술 실타래 풀어내듯 불러주셨다.
이젠 한 음 올리기도 어려워서 전처럼 간드러지는 육성으로 노래를 할 수 없지만
평생 내 마음의 노래였다고 눈에 이슬을 촉촉이 머금고 말씀을 건네주셨다.
덧붙여서 어쩌면 노래 구절도 우리 인생과 닮지 않았소? 하시며 한 소절 한 소절 정성껏 들려주셨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 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앙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 일제 유성기에서 들리던 노래 가락, 결핍을 모르던 유년시절
6.25 직후였던가? 백설희님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다. 보은여중에 다니던 때, 꿈은 많지만, 철은 없던 시절이었다.

경찰서에 다니던 아버지는 나에게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고 늘 지청구를 하셨다.
가슴이 답답하면 보청천이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여느 시골 계집아이와는 사뭇 다른 정서를 갖고 있던 것은 틀림없다.
지금은 개성시대라는 말로 개인의 성향이 존중되고 끼니 재능이니 라는 말로 오히려
대접을 받지만 내가 열다섯 살이던 시절에는 남이 알까 두려운 기질의 여식이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다니시고 할아버지는 고추와 인삼재배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집은 먹고 살만한 집이었다.
중학교 졸업 후에 밤에 몰래 서울 간다고 나갔다가 들켜서 머리채 잡히고 곱게 기른 갈래머리도 가위질을 당했다. 서러워서 울었다기보다 화가 나서 밤새 울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아버지가 그 무쇠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시다니...
그날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날이 아니라 내 꿈이 산산조각 난 날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얄궂은 세월을 보냈다.

■ 인생이 반 토막 난 결혼
친정집은 7남매였는데 네 명의 딸 중에 내가 제일 애물단지라고 빨리 시집보내야 한다고.
아버지는 상주의 과수원집 둘째 아들한테 나를 시집보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시집 보내어졌다. 가혹한 일이지만 운명을 거스르기엔 여자들에게 시대도 암울했고 나는 겨우
스무 살 때였다. 남편은 적당히 먹고 살만한 집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군대 다녀와서 집안의 몇 가지 사업을 배우고 있던 스물다섯 살 건장한 남자였다.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예쁘장한 내 모습에 반해 바로 날 잡자고 하면서 결혼을 서둘렀다. 중매쟁이 말은 절반의 절반만 들어야 하는데 경찰이던 아버지도 깜박 속아 나를 시집보내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셨다. 그러나 이미 내 인생은 반 토막 난 후의 일이다.
남편은 멀끔하게 생기고 돈 많은 집 아들 이라니 나도 먹고 사는데 문제 있으려나 하고
덜컥 시집을 갔다. 상주에서 사과 과수원을 크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 혼인 전에 상주에 다녀오셨는데 “과수원이 끝이 안보였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게 우리 딸 시집 잘 간다고 자랑을 내내 하셨다. 그날 아버지가 보고 온 과수원이 시댁의 마지막 남은 땅뙈기였다. 그것도 이미 임자는 다른 사람으로 정해진 후 껍데기만 남은 과수원을 보고 오셨다.
내가 시집을 간 후 남편은 결국 과수원까지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었다.
문제는 돈만 까먹었으면 마음 고생을 덜했을 터!
첫날밤을 보낸 후 3일 후부터 신랑이 보이지를 않네. 기생방에 들어앉아 술 먹고 다음날 아침이면 간신히 일어나니 누가 말릴 것인가.
과수원에 양조장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고 결국 집까지 날려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아버님은 뒷목잡고 쓰러지셔서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마음고생이 심하시던 어머님도 종내는 풍이 와서 나는 어머니 수발을 드느라 몸 고생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수롭게 넘기기에는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더군다나 예쁘게만 자라 역경에 몸을 맡겨보지 않았던 내가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을 감내해야 해서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수월치 않았다. 그래도 사람의 목숨은 질겨 또 하루하루 악몽같았지만, 숨은 붙어있어 살아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