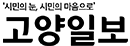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고양일보]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나올거요” 라고 우리 어머니들은 주저 없이 말씀하신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생을 드러냄이 아니다. 인생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하고 한고비 넘겼더니 다시 또 산 넘어 산을 만나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다들 살아오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책 속의 주인공이 될 법하다고 스스로 자평하신다.
진경숙 어머니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다. 팔순이 넘은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 또한 책 한 권으로 부족한 분이었다. 어머니는 이북에서 진신자로 태어나 지금은 진경숙으로 살고 계신다. 어머니께서 신자에서 경숙이 되기까지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한 많은 세월, 이제 격랑의 파도를 헤쳐 나와 항구에 정박한 고요한 배가 된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4대가 10분 거리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진경숙 어머니의 가족들. 시골에서도 흔치 않은 가족 구성원인데 도심에서 가당키나 할까. 그 향기로운 가족의 대들보인 어머니의 80여년도 파란만장이라는 이름으로 굴곡진 인생사를 담을 수 있었다.
어머님은 1942년생, 큰 따님도 손주를 본 젊은 할머니다. 4대를 이루는 동안 어머님도 80여년, 질곡의 인생길을 걸어오셨다.
■ 생이별, 이북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배 엘에스티호의 기적소리
“아가 너 함흥 이정목 살던 00집 딸 아니니”
6.25 전쟁 통에 배에서 내려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 나에게 천사처럼 나타난 차복남 어머니. 1950년 6.25 전쟁 난리 통에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마지막 배 엘에스티호에서 나는 부모님과 생이별했다. 내 나이 겨우 여덟 살...
부모님이 “신자야 배에 먼저 타고 있어라.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이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배가 출발하는 기적소리가 울렸지만,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고 나는 드넓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저 소리 내어 울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셔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배에 타고 계실 거라 믿고 나는 엄마 아버지를 부르면서 배가 떠나가라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사람들로 꽉 들어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배 안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결국 집에 다녀온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덟 살짜리 작은 계집아이는 울면서 며칠을 보내고 거제항에 배가 도착했다. 아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아주머니 한 분이 나에게 “아가 너 함흥 이정목 살던 00집 딸 아니니”라고 나에게 아는 체를 해주셨다.
아무도 없는 남녘 땅, 거제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 점잖은 아주머니는 나를 아는 분이었고 나는 그분을 기억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았다.

■ 전쟁고아의 올가미에서 나를 구해준 차복남 어머니
차복남 어머니...
나의 양 어머니를 그렇게 운명처럼 만났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머니도 함흥분이라 우리 동네에 살던 분이었다. 나의 친정어머니는 바느질을 워낙 잘하셔서 바느질 일감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직접 옷감을 갖다 주러 가실 때 나는 어머니 치마자락을 잡고 따라다니곤 했다.
그때 차복남 어머니가 나를 보시고 기억하고 있던 것이다. 정말 운명 같은 이야기다.
눈이 똘망똘망하고 피부가 뽀얗던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생면부지의 남녘땅에서 나를 살려준 구원의 여인 차복남 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발만 동동 구르던 작은 계집아이였을 때다.
차복남 어머니께서 “아가 나랑 같이 가자”하시면서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당시의 피란민들은 대부분 거제도에서 내려 목적지가 부산인 사람이 많았다.
차복남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은 8.15 광복 전에 이미 부산 영도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고, 어머니는 뒤늦게 마지막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오신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어머니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노란 껍질을 까서 한 입에 쏙 넣었더니 달달한 맛에 혼을 뺏긴 과일이 바로 바나나였다.
어린 나는 그 바나나 맛에 이북에 계신 부모님을 서서히 잊게 되었다.
이북에서도 궁핍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차복남 어머니의 집은 정말 전쟁고아가 될뻔한 나에게 궁궐 같은 집 그리고 구들장처럼 따뜻한 식구였다. 다들 온화한 분들이라 나를 친 딸처럼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셨다.
사실 내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한다하더라도, 나는 고마워해야 하는 여건이었다.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인데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
그런데 나를 식구로 챙겨주던 그 가족을 생각하면 운명의 여신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내내 내 가슴에 피멍처럼 남은 자국이라면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내가 그 배에서 부모님을 애타게 찾던 그 마음보다 우리 부모님이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숯검정이 되었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터진다.
나는 차복남 어머니 댁에서 너무 사랑받으면서 성장해서 함흥의 부모님을 서서히 잊었다.
속이 다 타들어 갔을 우리 부모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운명의 장난이라고들 일컫는 모양이다. 나는 그렇게 생이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차복남 어머니 집에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나를 둘러싼 운명은 고운 길만 걷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또다시 운명의 장난에 휘말리며 남편을 만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