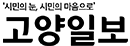세 번째 매듭 ; 남편의 그림자, 달빛아래 숨기놀이 하는 7남매
나는 친정에서 딸 셋으로 성장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 와서 같이 지내다 돌아가셨다.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장인・장모한테 남들이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효자였고 우리는 생전 싸움을 안했다. 애들 앞에서 큰소리 내 보지 않았던 우리 품에서 자란 큰딸 주신이가 “엄마 나도 시집가면 엄마처럼 살 줄 알았더니 싸울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엄마는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았어?”
싸울 일 없는 부부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 참는 것도 지혜다. 속이 곪아 터지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남편한테 의지하기보다 내 할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지혜다. 그건 어머니에게 배운 덕이다. 어머니는 내가 애들한테 지청구(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라도 하면 보따리 싸서 나간다고 하시면서 대문열고 나가셨다. 갈 데도 없으면서 집 나가는 시늉을 했다. 애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남편도 장모한테 잘하고 다들 서로 못해 줘서 안달이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그 어렵던 시절을 싸우지 않고 버텨냈다.
누에를 치던 우리 집 뒤꼍은 뽕나무밭이었다. 남편과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김치에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밥 한 공기 뚝딱 비우며 저녁상을 물렸다. 7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쪼르르 달려 나갔다. 어느새 남편도 막내를 업고 아이들 무리에 끼어 신이 났다. 그날도 숨바꼭질하느라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뒤꼍으로 나가자마자 깔깔대는 웃음소리에 같이 살던 친정어머니는 “'딸만 잔뜩 낳아놓고 뭐가 좋다고 신이 났나 망신스럽다”며 혀를 끌끌 차셨다.
내심은 사위가 든든하고 고마웠을 게다. 어머니 입가의 미소가 이미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천하의 호인이던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슬며시 올라가 보면 아이들은 달빛이 드리운 그림자 뒤로 요리조리 잘도 숨었다. 꽁꽁 숨은 들 남편 손바닥 안이지만 그래도 숨어보겠다고 뽕나무 잎 사이로, 언덕배기 수풀 속으로... 한 녀석 한 녀석 남편 손에 붙들려 나올 때마다 까르르까르르 다들 더 신났다. 뭐가 그리 좋은지.

넉넉하지 않아도 욕심 없었고 삶이 고단해도 인정 많은 남편과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그 맛에 견뎌냈다.
남편은 먼 길 떠난 지 오래지만 40년이 지나 그때 그날처럼 우애 좋은 남매들은 노년의 내가 서글플 겨를을 안준다. 한숨 쉴 틈을 안준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 그래서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이 나이 든 내 차지까지 온다.
주말이면 마당은 아이들의 차로 꽉 들어찬다. 아이들은 나를 차에 싣고 꽃놀이를 떠난다. 꽃 대궐 이룬 꽃밭에서 나는 모델이 되어 아이들의 카메라 셔터 앞에서 웃고, 하트를 날려본다. 팔도의 산해진미는 덤이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엄마 얼굴이 뭐 볼게 있다고 여기서 찰칵 저기서 찰칵!! 나만 행복해서 미안하다고 남편한테 간간이 말을 걸지만 알아들을 리 만무하다. 제대로 해 먹이지도 못하고 옷이며 신발이며 언니들한테 물려 받아가며 내꺼 한번 제대로 가진 적이 없던 아이들. 미안하고 고마운 내 새끼들이다.
나의 오래된 아픈 기억들까지 추억 보자기로 싸매준 우리 아이들. 달빛 아래 숨바꼭질하던 그 천진한 마음으로 내내 살아줘서 노년의 나를 복 많은 여자로 만들었다. 사랑은 대대손손 대물림이다.
네 번째 매듭 ; 고단한 시골 아낙, 밤새 누에 밑 가리고 물옴 잡히다
밤새 누에 밑 가리고, 새벽에는 텃밭 일구고, 낮에는 모심느라 24시간의 8할은 일하느라
몸이 고단했다. 365일 내내, 쉴 틈에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쪽잠을 청하기 일쑤였다.
앉으면 꾸벅꾸벅 졸고...고생 안 시킨다고 첫날밤에 약속한 남편의 호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큰 동서는 내가 졸고 있으면 간간이 지청구를 했는데 누에 치고 모 심느라 몸을 가누기 힘들 때가 다반사였다.

누에는 깨끗한 뽕잎만 먹고 자라는 애들이라 고추밭에서 농약이라도 날아와 우리 뽕 밭을 스치기만 해도 금세 누에들이 알아차린다. 잘 자라지도 않고 애를 먹였다. 우리 애들이 학교 다녀와서 잠실 방에 들어가서 누에도 치고 먹이도 챙겨주느라 다들 애썼다.
간간이 잠실에서 잠들어 있는 딸내미들을 보고 있으면 자고 있는 걸 깨우자니 안쓰러워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누에똥이 잔뜩 있어도 너무 졸려서 그 방에서 잠들어 있는 딸내미 보면 어린 거까지 고생시키니 애미 속은 다 타들어 갔다. 여자아이들이라 꼬물거리는 누에를 보면서 엄마야 징그럽다고 도망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 다들 힘들었던 기억 때문인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번데기는 그다지 즐기지 않는 음식이 되었다. 그래도 군말 안하고 엄마 일손 돕는 우리 애들은 참말로 착했다. 우리 친정어머니도 뽕도 잘 따고 일도 많이 하셨다. 뽕잎을 딸 때도 내가 반 포대 하는 동안 어머니는 한 포대씩 땄다. 뽕 농사는 둘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했으니까 근 20년은 농사를 지었다. 온 가족이 십시일반 일손을 보태면서 누에 농사를 짓느라 다들 애 많이 썼다.
정작 힘든 건 누에치는 것 보다 모심고 다리에 물옴(살가죽이 부풀어올라 속에 물이 잡힌 것)이 생길 때였다. 밤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었다.
그때는 장화도 딱히 없어서 시원찮은 양말 신고 들어가면 거머리에는 안 물리지만 물에 젖은 양말은 물옴이란 녀석한테는 못 당했다. 살가죽이 부풀어 올라 속에 물이 잡힌다.
추측해 보건데 외양간 오물이며 농약들이 물 댄 논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독소가 만들어 졌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내기철에 물옴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살이 얇아서 물옴이 올라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달래느라 힘들었다. 피부는 울긋불긋, 간지럽고 긁기라도 하면 더 부어올라 종아리가 허벅지만 해졌다. 그 시절 고생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참, 사는 게 고역이었는데 딱히 방도가 없어 미련하게 또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동네에 묘자리를 두고 있던 00네가 이장하던 날 땅 속에서 미라가 나왔다.
동네꾼들이 다들 나와서 구경하는데 나는 집 밖을 나가볼 시간도 없었다. 우리 애들이 미라 봤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자취방에 김치 담아서 보내느라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었다.
마을에 버스가 7시 10시 12시 3시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시간을 맞춰 김치를 손에 들려 보내는 것이 그저 내가 할 일이었다. 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다 찾다 보면 우리 애들은 누가 챙겨주나. 나, ‘송수돈’이 없는 시절이 있었다. 한창 누에를 치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내가 없어야 우리 새끼들이 살았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너무 다행스러운 건 나이 들어 ‘송수돈’이라는 내 이름을 아이들이 찾아주었다. 늦복이 차고 넘치는 할미가 되었다.

희로애락의 올가미에 갇혀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세월의 나이테를 쌓아간다. 우리 딸 은주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고 창가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싶다.
혹여 그 햇살이 한낮의 졸음을 데려온다면 꿈을 꾸고 싶다. 그 졸음을 타고 오래전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달빛 아래서 우리 7남매가 까르르 웃으면서 남편과 숨바꼭질 하던 그 뽕나무 잎 사이로 나도 숨을 것이다. 그 속에서 나도 같이 웃고 마냥 행복하고 싶다. 보고 싶은 그이 박종순, 그리고 우리 자식들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우리 식구들의 냄새가 곳곳에 밴 우리 집,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우리 집 내 노년을 복되고 값지게 만들어주는 우리 집 곳곳에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를 두 손 모아 봅니다. 이만하면 부끄럽지 않았고 소박하지만 자존심을 지켰다. 다 덕분이다.
주신이 주미 주란이 주윤이 주나 은주 은정이의 엄마여서 행복한 고덕 상장리 송수돈.
2021년 5월 3일 따뜻하고 예쁜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