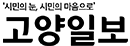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뒷짐 지고 윗마을로 오르시는 할머니께 차순태 어르신 댁을 여쭈었더니 할머니께서 “순태, 그니 집은 이짝 골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언덕 집이여” 여든 일곱의 어르신을 순태라고 부르신다. 그렇다면 할머니도 동년배이거나 손위 누이 쯤 되는 분이다. 무수한 세월을 같이 걸어온 이웃들이다.
어르신 댁 방문을 열면 흑백사진 속의 부부가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다. 차순태 어르신의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다.
뭉클한 마음에 물끄러미 바라보던 곁눈으로 어르신의 눈에 맺힌 이슬을 보고 말았다. 여든 일곱의 ‘노인’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적신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존재는 떠난 뒤에 더 애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누누이 대물림처럼 말하고 있다.
■ 보리 고개의 뒤안길
나는 1933년 을해생이다. 동갑네 28명이 을해생 동갑네 계를 했는데 다 떠나고 이제 다섯이 남아 먼저 간 친구들을 회억하고 있다. 우리 세대가 일제 강점기부터 6.25를 다 거치고 보릿고개까지 넘어왔다. 인생에 곡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은 유독 우리 세대가 한 많은 세월을 살아온 거 같다. 우리 마을도 일제 강점기에 수탈로 몸살을 앓았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이 났다. 인민군보다 마을 빨갱이가 더 독하다고 하더니 한동네에서 살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득세를 해, 완장차고 다니며 동네를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슬며시 사라져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는 그들이 있었다. 전쟁 후에 그들은 살아남았다. 마음 같아서는 돌팔매질로 다스려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착해서 그들을 살렸다. 못된 짓을 눈감아 준 마을 어른들의 품성에 고개가 숙여진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미덕, 그래서 인심 좋은 마을로 기억되었다.
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 속을 새카맣게 만들어버린 불효자다. 어머니는 손맛이 좋아 홍두깨로 밀어서 가락을 뽑은 국수도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이 먹을 만큼 입맛 돌게 만드셨다. 김치 쪼가리 하나만 얹어놓아도 밥상은 푸짐했다.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골고루 배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다. 손마디가 매워 목화솜으로 베 짜는 솜씨가 일품이셨다. 근방에 소문이 나서 어머니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드나들기도 했다.
손맛도 좋고 솜씨 야무진 어진 분이셨다. 바깥일 하는 남편에, 객지로 떠도는 아들, 혼자서 큰살림하려니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싫은 내색 한번 안하셨다.
까마득한 그 시절 동네 친구들과 1키로 정도를 걸어 학교에 다녔다. 당시 1키로 정도 거리는 동네 마실 밖에 안되는 거리였다. 우리는 상중리에서 대전까지 걸어 다녔다. 그것도 식장산을 넘어서 더군다나 나뭇짐을 지고….
그 한 많은 보릿고개를 넘을 때 다들 먹고 살 방편으로 찬밥 더운밥 거릴 처지가 못 되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토요일 오후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일요일 새벽밥 먹고 출발했다. 그 무거운 걸 지고 12시 전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장작을 쪼개주시면 그걸 짐 보따리 만들어 다들 마을 어귀에 모여 같이 출발했다. 혼자 걸으면 나뭇짐에 식장산을 넘기가 대간하겠지만 여럿이 모여 어울렁 더울렁 그 고갯길을 넘었다.
식장산 고갯길, 그리고 보릿고개 길. 상중리는 식장산 끝자락이다. 우리는 그 산을 넘어 대전 인동 다리까지 또 걷는다. 맨몸으로 가도 다리가 휘청할 거리다. 등에 나뭇짐을 지고 잰걸음으로 산을 올라 점심 전에 인동에 도착한다. 몇 푼 손에 쥐고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 외에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논밭도 없고 성한 몸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우리 집도 할아버지 계시던 시절에는 먹고 살만한 집이었다. 장에 쌀도 줄만한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유산이야기, 초가집들을 개량하면서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만났다. 마당을 파다가 항아리 두 단지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다들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두 단지에는 엽전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 옛날 시골에 은행이 있기를 하나 돈을 보관할만한 마땅한 방법이 있기를 하나…. 할아버지 생각으로 땅속에 묻는 것만큼 안전한 방법이 없었다. 당신 돌아가실 때도 기억하지 못하셔서 결국 후손들이 엿 바꿔먹는 형국이 되었다. 이미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구리로 남아 있는 엽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엿 바꿔먹고 비누로 물물교환하면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했다.
헛웃음이 나오지만 지난 시대를 살아온 조상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무수한 세월 속에서 돈이 엿 바꿔먹는 구리로 전락하듯이 세상은 돌고 돌아 오늘의 가치가 내내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래서 천금 같은 내일보다 ‘작은 오늘’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 부평초 같던 젊은 날들
젊을 때는 시골살이가 답답해서 객지로 나가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식구들 데리고 서울로 떠났었다. 서울 죽림동에서 타올 외판원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태원을 돌고 돌았지만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다. 때마침 1968년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새벽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기관총 소리에 놀라 전쟁이 난 줄 알고 혼비백산했었다. 아침에 들려오는 뉴스에 종로 경찰서장이 죽었다는 뉴스와 무장 공비들이 대거 남침했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서울도 살 데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30대 중반에 내려와서 고향을 지키고 있다.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지만 농사짓는 땅에 부평초 같은 마음을 묻어버리자 시골에서도 나를 찾는 일들이 많았다.
경찰서 정보과 홍보위원회에서 총무를 맡았다. 1970년대는 한 달 한 번씩 반공영화를 마을마다 틀어줬는데 내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일을 진행했다. 이장들이 마을회관이나 학교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가서 영화를 보여주었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시절이라 반공영화 상영은 주민 교육용으로 활용되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대립 구도라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되는 것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산에 나무들이 꽉 꽉 들어차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산에 나무를 죄다 벌목해서 생계 수단으로 썼었다. 흔히들 벌거숭이 산이라고 했던 그 산의 조림사업에 나도 참여했었다.
아침이면 호루라기 매고 주민들 불러 모아서 숲 가꾸기를 했다.
마을 경로당 공사 때 찬조금 받느라 서울 사는 출향 인사들 찾아서 찬조금을 받아오기도 했고 동네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해결해주기도 했다.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서 하던 일이었다. 나는 좋아서 그 일을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집안 경제에는 관심 없고 밖에 나가 남 일이나 해결하고 다니니 속이 짓물렀을 것이다. 지금 곁을 지켜주는 아내한테는 엎드려 절해도 모자란다.
■ 돌고 돌아 하능 마을의 어른이 되다
고향 지키면서 아침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산내 곤령터널을 지나 산내초등학교 앞에 도착한다. 내 친구 오토바이를 잘 모셔두고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에 나간다. 친구들을 만나 놀고 5시면 퇴근하듯이 집으로 온다. 아직 다리가 성하니 오토바이 시동을 켤 수 있다. 여든 일곱의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씽씽 달릴 수 있는 것도 내 복이고 아내 덕분이다. 어머님이 부평초 같던 내 젊은 날을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산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다. 그 시절이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고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갖게 됐으니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 맞다면서 위로하고 있다.
오늘 아침도 오토바이 시동 켜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다.
지금은 떠나는 뒷모습만 보여드리지 않는다. 땅거미 내려앉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은 어머니, “어머니 순태입니다.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