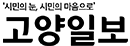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고양일보] 누구나 꽃 같은 시절이 있다. 어머니댁 낮은 담장 밑으로 키 작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낮 달맞이꽃, 소담스런 맨드라미, 과꽃, 이름도 어여쁘고 자태도 얌전하다. 이수자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다.
■ 고단한 삶속에 한줄기 빛,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루 종일 새벽부터 집안 살림에 막내 시누 업고 우물물 길어오고 밭농사에 누에까지..
작은 몸으로 무쇠처럼 일만 했다.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한순간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내 삶에 유일한 희망은 시할머니였다. 시할머니도 나와 같은 고단한 시절을 분명히 보냈던 분인데 나를 예뻐하시고 귀하게 대접해주셨다.
항상 ‘우리 예쁜 아가야’ 라고 불러주셨다. 밥상에서 김치 한 젓가락이라도 꼭 내 숟가락 위에 얹어주셨다. 그게 할머니의 마음이었다. 시할머니가 저승으로 떠나시던 날, 새벽 4시면 일어나시던 할머니가 기척이 없어서 방에 들어가 보니 주무시면서 이승을 떠나셨다.
유일한 나의 안식처이던 할머니 상여 뒤를 따르면서 피를 토하듯이 울었다.
다시 남편이 제대를 하고 나의 희망이 되었다. 듬직한 사람이라 식구들 몰래몰래 나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 주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던 건 남편이 꼭 잡아준 그 손이었다. 내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꼭 존댓말을 하고 손을 꼭 잡아준다. 스무 살 나를 붙잡아준 그 힘을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다.
6남매를 낳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여느 여자들과 비슷한 인생길을 걸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듬직한 남편 만나서 마음만은 호강했다. 남편은 농사를 나에게 맡기고 청주로 나가 인쇄업을 했다. 나는 시골에 남고 남편만 청주로 나가서 먼저 자리를 잡았다. 요즘 여자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주말 부부 아니 월말 부부를 나는 50년 전부터 했다고 며느리들에게 웃으면서 얘기하곤 한다.
없이 살아도 정이 좋아야 한다. 여자들은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면 고단한 일상을 다 잊을 수 있다. 어디 여자뿐일까, 남자도 마찬가지다.
■ 인생에 정답은 없다
우리들은 80년 세월 속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뭐든 헤쳐 나갈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아무리 다정해도 우리 6남매 중 서울대 나오고 가장 넉넉한 아들이 이혼을 했다.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아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된다고 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 아들도 큰 사업하면서 사회활동 하느라 집안 건사 안하고 오히려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사람인지라 20년 동안 외로웠고 남은 시간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우리는 둘의 의견을 존중했고 지금은 서로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인생에 정답이 없어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숙제를 잘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과 타협하는 방법이다.
나이드니 몸은 기력이 없어졌지만 길이 보인다. 간간이 30여년 써온 일기장을 넘겨보면 그 안에 이미 길이 나 있었다. 눈이 침침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기쁨이 있다. 나이를 먹어야 볼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든다. 여생은 그저 자애로운 할머니로만 살 것이다. 뜻대로 되어야 할텐데...
밤이면 어디선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린다. 마당 있는 집이 주는 낭만이다.
새벽에는 기온이 내려가 이불을 끌어와서 배위에 얹어야 한다.
아, 가을이 깊어가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