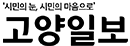고목(古木)의 그늘이 주는 평안, 느티나무 같은 사람
마을 입구 느티나무 한그루, 오랫동안 오가는 주민들의 벗이 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메아리로 돌려주고 지나는 차 소리, 세상의 소란한 소리도 모두 삼키며 든든한 이웃이 되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 동네에서 나이 많기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말 그대로 이원의 ‘터줏대감’이다. 느티나무와 벗 되는 터줏대감이 한 분이 더 계신다. 이종무 아버님
무수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이 아버님을 지키고, 아버님도 마을을 저버리지 않았다.
■ 징용, 겁에 질린 얼굴로 내 시야에서 멀어지던 형님의 뒷모습
1930년대에 태어났으니 일제 강점기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해방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피난길을 헤매던 유년의 기억까지 우리 동년배들의 인생도 고단하기로 말하자면 밤을 새워 토로해도 모자란다.
내가 대 여섯 살 무렵, 형님이 징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싸리문 뒤에서 훔쳐보면서 소리 없이 울어야 했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절규도 잊을 수 없다.
일본 순사 손아귀에 목덜미를 잡힌 채 겁에 질린 얼굴로 내 시야에서 멀어지던 형님의 뒷모습을 어찌 잊을까.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알게 된 날이었다.
그 이후로 살아서 형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 해방이 되어 징용으로 끌려간 이들을 태우고 오던 우쿠시마호가 폭파되어 바다의 원혼이 된 형님의 영혼을 바다에서 만나고 돌아왔다.
징용으로 끌려가던 형님의 뒷모습이 떠올라 며칠을 앓아누웠다. 핏줄은 참으로 애틋하고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 험악한 세상이 되어 뉴스 속에서 혹간 이웃의 이야기 속에서 혈육 간의 분쟁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 바람결에 날아온 쌀겨 껍데기 그리고 비극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은 불상사는 참으로 어이없는 쌀겨 껍데기에서 비롯되었다. 아홉 살 무렵 쌀겨 껍데기가 오른쪽 눈으로 들어가서 간질간질하더니 결국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다. 밤새 눈알이 빠질 거 같더니 아침에는 얼굴까지 퉁퉁 부어서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변변한 안과가 있기를 하나 며칠 지독하게 앓고 우린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다들 잊었다. 나도 며칠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더니 어느새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훤하던 세상이 희미해져 가고 결국 약시가 되어 한쪽 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군대도 면제됐으며 나머지 한쪽 눈까지 나이 들수록 약시가 되면서 사회생활을 변변히 할 수 없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그 쌀겨 껍데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오히려 엉금엉금 기어 오던지 티끌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던지
그렇게 소리 없이 엄습해서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좌지우지한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눈에도 안 보이는 ‘코로나’라고 우리는 3년간 내내 부르짖지 않았던가?
■ 장리쌀, 하늘바라기 농사꾼들의 피고름을 짜다
6.25 때 잠시, 김천으로 시집간 누님댁에 피난을 다녀오긴 했지만, 총성이 잦아들 즈음 다시 이원으로 돌아왔다. 피난 행렬을 따라 김천까지 가면서 한여름 땡볕 내려 쬐던 전쟁 통에 엄마를 놓칠세라 어깨에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잰걸음을 내딛던 열네 살의 내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훤하다. 피난 길 들판을 지나가면 물 댄 논에 개구리들이 어찌나 구슬피 울던지 우리 피난민들 처량한 신세를 녀석들도 알기는 알았던가 보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절의 부산물들이 험한 꼴일 수밖에 없던 때다.
우리 동네도 40호가 조금 안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땅덩어리가 적지는 않았지만 변변치 않은 동네라 부락민이 많지 않았다. 초가집 짓고 농사지면서 근근이 먹고 살았다. 농사꾼들이 많아서 다들 하늘바라기였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날씨는 치명적이라 하늘 바라보면서 가뭄 들지 않게, 홍수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하늘바라기 신세였다.
누님들과 형님 5남매 중 나는 막내였다. 누가 나에게
“인물도 잘 생기셔서 막내라서 귀여움 많이 받으셨겠어요?”
라고 속 모르는 소리를 한다. 얼굴 밉다는 소리는 안들어 봤지만 다들 쌀 구경하기 힘든 시절에 막내라고 귀여움받을 여력이 어디 있을까? 고구마라도 나눠 먹으려면 형님과 누님 눈치도 봐야 하고 곤궁한 시절이었다. 어머니께서 홍두깨로 밀어주시던 칼국수 한 그릇이면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이 후루룩 뚝딱 비우곤 했다.
먹고 살 거리가 없으니 마을에 농사 좀 짓는 집에서 장리쌀(장례쌀)을 얻어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봄에 쌀 한가마니 빌리면 가을에 한가마니 반으로 되갚아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반가마니를 얹어서 줄 수 있을까. 가난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숨이 턱턱 막혔다. 굶어죽지 않으려니 피고름이라도 짜야했다.
■ 국민학교를 두 번 다닌 사연인즉
어렸을 때 살던 이야기하면 어찌 살았나 기막혀 말문이 닫힌다. 국민학교도 두 번이나 다녔다. 먹고 살거리가 없으니 월사금을 제대로 못내서 선생님이
“정무야 집에 가서 월사금 가져와라”
급우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쫓겨나듯이 나와서 나는 그 이후로 2년을 학교에 가지 못했다. 끼니거리도 없으니 언감생심, 학교는 나에게 사치였다.
2년을 쉬고 다시 3학년으로 들어갔더니 마을에서 나에게 형님 하던 애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하기야(하기사) 내가 형님 하던 형들도 나랑 같이 학교를 다였으니 제 나이에 학교 다니는 것만도 다행이던 시절이었다. 서로 어렵게 산 이야기 터놓기 시작하면 밤새는 줄 모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