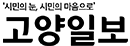이복용 (1934년~)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만 실향민이 아니다. 어르신도 실향민이셨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멱 감던 시냇가의 추억자리를 잃었다. 대청댐에 수몰지구가 된 덩기미와 피실 고향집도 잃어버렸다. 그리움만 남은 마음의 고향이라시며 당신도 실향민이라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다.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비단 어르신뿐이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고향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르신의 인생 한 대목 한 대목을 엿보면서 잠시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 보기로...

■ 수몰 이주 이후 달라진 삶의 여건들
산 벚꽃이 환하게 피던 날 아내를 만났다. 19세가 되던 해에 20세 아내를 맞았다. 사돈 집안에서 옥천군 용천리 아가씨를 소개해줬다. 아내는 보성 오씨 오**이야. 산 벚꽃이 환하게 피었던 4월에 아내를 처음 만나고 동짓달에 혼인했으니 7개월 만이지. 예전에는 지금처럼 벚꽃이 온 마을에 내려오지 않고 산이나 학교에만 있었다. 아내는 족두리, 나는 사모를 쓰고 초례를 올렸다. 그때만 해도 신랑 신부가 가마를 탔으니 돌이켜보면 진풍경이다. 아이는 형제만 다섯을 두었다. 승욱 승경 승선 승철 인영, 아이들 이름은 내가 다 지었는데 막내는 한문 공부했던 저력으로 어질 인에 영화 영으로 인영이라고 특별히 지어줬다. 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다. 딸 가진 친구들 보니까 용돈도 많이 받고 속 이야기도 많이 나누던데. 며느리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순 없고 농사를 짓다가 대전으로 옮긴 사연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대청댐을 지으면서 마을이 물에 잠겨서 떠나야 했다. 쫓기듯이 고향을 등지고 나오게 됐다. 결국 실향민이 된 거야. 원래 댐을 만들려고 했던 곳은 지금의 대청댐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 일제시대 때부터 말뚝을 박고 공사 준비를 했는데, 그 땅이 하필 *** 대통령 부인 ***여사 가문의 본토였기 때문에 대청댐으로 옮겨야 했다. 보상받고 처음엔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대화동 공단으로 나왔었다. 그런데 기름밥이 나와 맞지 않아서 시내로 나왔다. 중동 10번지 지금은 인쇄거리지. 그때는 후생사업이 성업할 때고 처남이 후생사업을 하고 있었다. 중동에서 여관을 20년하고 성남동 정동 나중에 선화동 법원 앞에서 오래 정착했다. 지금은 법원이 둔산동으로 옮겼지만, 그때만 해도 선화동과 법원은 대전의 중심지였다. 45세에 대전으로 와서 20년 동안 여관 일을 했다. 시내 중요지역에서 여관을 하면서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나도 생업으로 든든했었다. 그때만 해도 여관이 역할을 하던 때라 밥벌이도 되고 좋았다.
두 집 살이 하던 상이군인 정 씨 등 여관 일을 하면서 기억나는 사람들도 참 많다. 며칠 묵는 뜨내기부터 10여년 세 들어 살던 오랜 친구까지. 특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상이군인 정 씨는 서울서 살다가 이곳 전장에 부임했는데, 전투 중에 총상을 입고 말았다. 그런데 입원했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와 눈이 맞아서 딴살림을 차린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둘이야. 작은 부인의 딸은 대전에서 결혼식도 했어.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라 못할 얘기가 없었다.
다른 사람은 두 집 산다고 흉볼지 몰라도 나는 이해한다. 살다보면 의지대로 정말 안 되는 일과 여건이 있다. 규범으로는 면피할 수 없지만, 실수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살아봐야 그런 걸 알아. 20년 넘게 하던 여관을 그만둔 건 아내가 풍이 걸린 뒤부터였다. 장사를 못할 것 같아서 대전 법동으로 왔다. 아내가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기운이 빠져 버렸다. 안 도와주면 못 사니까 내가 살뜰히 챙겨줘야 한다. 그래도 아내가 너무 고맙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 그게 아내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더 신경써서 하고 있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둘이 행복하지. 남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일어나면 청소 싹 하고 쌀 씻어서 불려 놓고 나와서 운동을 한다. 몸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아들이 병원 예약까지 했는데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해지니 예약을 취소해도 되겠더라고. 다들 건강하게 늙었으면 좋겠어. 평범한 삶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돌아보면 내 삶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전쟁 통에도 농사짓고 한문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남다른 행운이었다.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일은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켜드린 일이다. 아버지는 86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91세에 돌아가셨다. 시쳇말로 천수를 누리신 거지. 하지만 두 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은 전혀 달랐다. 내 나이 예순 때, 대전의 중앙시장에 나와서 형수님 옷 한 벌 해드린다고 오시라고 했는데 어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왠지 이상해. 기운이 다 빠져버린 마지막이라는 느낌이랄까. 그때 한번만 더 전화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마침 여관에 친구들 열댓 명이 놀러 와서 고스톱을 한참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귀신에 홀린 듯 했고 너무 충격이었다.
옆집에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집에 좀 가보라고 했어도 그런 기막힌 일은 면했을 텐데. 너무 가슴 아파. 아버님 임종 때는 자녀들과 손주들 불러놓고 손도 꼭 잡아드리고 꼭 껴안아 드렸는데 어머니께는 아무것도 못해 드렸어. 그 일이 후회되고 정말 가슴이 찢어져. 두 번째 후회는 역시 공부를 안 한 거야. 모임에서 추사 김정희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 추사가 생전에 써놓은 한문이 여기저기 전시돼 있었지. 아버지도 이곳에 오셨을까? 당신의 아들이 추사처럼 멋진 한문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한문 공부를 시키실 적에 낙심하셨을 것 같아. 하지만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걸 어떡해. 살아보니 남자에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헤맸지만, 가정만큼은 꼭 지켜야 해.
가정 소홀히 하는 사람들 보면 헛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랑이 미워도, 아내가 미워도 가정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다. 나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결국 평범한 삶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지금 마음은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질문이 온다면 그건 바로 그저 여여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 회신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