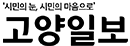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어른’이 사라졌다. 나라의 어른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어른’이란 사회가 분열되고 시끄럽거나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묵직한 범종처럼 울림을 주고 사자후로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평생을 헌신하거나 사회적 경륜과 삶의 지혜가 깊고 넓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른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게 됐다. 과거 70년대 엄혹한 유신 시절에도 용기 있게 정부에 저항하고 국민에게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어른이 있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에도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던 어른들이 있었다. 우리 역사에는 난세에 영웅이 나라를 구하고, 힘들 때 백성의 마음을 보듬어 주던 어른이 있어서 이만큼 나라를 지탱해 왔다. 최근 나랏일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망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은 10%에 가깝고, 나랏빚은 4년 동안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다. 정치는 시끄러워 국민이 나랏일을 걱정한다. 코로나로 근 2년 가까이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국민의 마음은 이미 한겨울이다. 그 어느 때 보다 따뜻한 어른의 위로 말씀이 절실 때다. 하지만 좌우 진영으로 나눠진 사회는 서로 죽자고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들의 악다구니만 들릴 뿐이다.
586세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는 정치가 최우선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힘을 가진 권력자의 목소리만 커지고 권위 있는 어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됐다. 어쩌다가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몰아세웠다. 꼰대라는 말이 듣기 싫어진 어른은 가정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급기야 나랏일을 걱정해줘야 할 어른까지 안 보이기 시작했다. 어른의 목소리가 안 들리자 세대 간의 단절과 격차는 더 넓어지고 말은 더욱 안 통하게 됐다. 사회의 모든 것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됐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필두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남과 여, 사업자와 근로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등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하게 나뉘었다. 내 편은 선이고 다른 편은 악으로 몰아붙인다. 당연히 대화와 건전한 토론은 사라지고 비난과 거친 말만 난무한다.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없어지고 타협과 합의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 밀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싸우니 사회는 더욱 황폐하고 거칠어졌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대 강국이 될 정도로 커졌다. 게임과 노래 및 영화 등 문화사업은 전 세계에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다투느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도는 전혀 발전한 것이 없다. 분명 과거보다 잘살게 돼서 몸집은 커졌는데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머리는 오히려 작아지고 인색해졌다. 너나없이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는 못살았어도 한 집안에 5~6남매씩 자랐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고 배우면서 컸다. 형한테 양보하고 동생은 보살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컸다. 그러나 그런 사회가 핵가족이 되면서 급격하게 변했다. 60년대 말부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다. 그 이후 한국의 가정은 1~2명뿐인 아이들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마 50년 전 태어난 세대의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20여 년 전부터 어른의 목소리가 들리게 않게 된 것 같다. 가부장제 시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정에서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권위도 같이 사라졌다. 그 대신 엄마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른의 목소리가 점차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한다. UN ‘세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지난 3년(2018~2020년)간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37개국 중에선 터키(4.95점), 그리스(5.72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에서도 62위에 불과하다. 사는 게 나아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상대적이다. 사회가 건전하고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작동하고 공정하다고 느끼면 불만이 적어진다.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지만 상대적 빈곤을 더욱 뼈아프게 느낀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다. 예전에는 잘사는 사람들을 보고 저놈들은 “도둑질을 했든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지 지들이 뭐가 잘 나서 저렇게 잘 살겠느냐”고 눈을 하얗게 뜨고 봤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1945년 독립 이후 짧지 않은 기간 참으로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변화를 겪었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고 5~60년대의 가난한 시절을 살아본 기성세대와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난 MZ세대는 서로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왔다. 당연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너무 급격한 성장기를 겪었기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성숙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가난한 시절이 몸에 밴 기성세대는 더욱 어색할 수밖에 없다. 세대 간의 충돌은 당연하다. 물론 어른들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세상의 온갖 풍상을 헤치고 살아온 원로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의 무게는 분명하게 다르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 교육, 종교, 문화, 경제, 외교, 국방 등 사회 근간의 원로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가 혼탁한 이 시대에 그 많은 정치 원로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나라를 지키고 민주화를 하겠다고 몸 바쳐 싸웠던 어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100세 넘은 김형석 교수가 나라 걱정을 한다. 평생을 민주화와 정의만 외친 김동길 교수와 세계적인 지성 이어령 교수의 말씀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세워서 나라의 어른들에게 국가 미래를 위한 충정의 말씀을 청해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