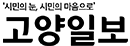가끔씩 글쟁이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화가로 변신하는 날이 있다. 그날도 마음의 물감을 풀어 정물화 한 점 그렸다. 나란히 옹기종기 앉은 장독대, 투박한 항아리였던 장독대를 한 폭의 그림 속에 앉혔다. 낮은 담장 아래 봉숭아꽃 옆에 앉혀 놓으니 근사하다.
“어르신 봉숭아꽃 너무 예쁘네요. 잘 가꾸셨어요.”
“아니 내가 안 심었어. 저절로 폈어.”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눈보라가 밀려와도 때마다 그 날이면 알아서 착착 자기 자리를 지켜.
변덕스럽고 궂은 날 좋은 날 유난떠는 사람들보다 훨씬 양반이야“
어르신도 꽃들에게 인생을 배우고 우리는 집안의 철학자가 된 어르신에게 또 배운다.
자연은 어느새 우리와 지경을 달리한다.
■ 마당예야 뜰팡예야 내 이름 순례는 어디로 숨었을까
어릴 적 내 이름은 마당예였다. 어머니가 일하다가 마당에서 나를 쑥 낳았다고 마당예라고 불렀는데 간간이 놀림말로 뜰팡예(마당)예라고도 불렀다. 순례라는 내 이름은 어디로 숨었는지. 태어난 날의 돌발 상황이 바로 이름이 되었다. 여자알기를 손톱 밑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시절이다. 부엌에서 밥 짓다가 세상 구경했다면 부엌예라고 불렀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11남매를 낳았는데. 나는 열 번째였다. 다 황천길로 떠나고 둘 남았다.
잼마을 살다 6.25때 지금 금천리로 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고향 잼마을(구술자의 발음대로 표기)은 동네 날망에 있었다. 6.25때는 산에서 인민군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 사는 동네로 피난을 왔다. 인민군들이 동네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총을 쏘아 대는 바람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다. 이 동네는 60호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려나 하고 산에서 여기로 피난 왔다가 아예 눌러 살게 됐다.
집에 농사지을 땅뙈기도 변변치 않아서 부모님은 품팔이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다. 형제들이 11명이라 끼니 챙겨먹는 게 우리 식구들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다. 오빠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다
“순례야 먹고 살기 어려우니 시집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어라”
하면서 선 자리를 알아보고 휴가 나온 그 보름 만에 나를 금산 추부 보광리로 시집보냈다.

19살, 아무것도 모르던 시골 처녀였던 나는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가 그 작은 동네였다. 결혼이 뭔지도 몰랐던 시골 처녀였다.
입하나 덜겠다고 시집갔더니 처마 끝이 쪼매난 내 키만큼 낮아서 시댁이나 우리 집이나 먹고 살기 어렵기는 매 한가지였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한숨만 나왔다.
첫날밤에 남편이 무서워서 뒷문 열고 도망가는 어이없는 시골처녀였던 나의 험난한 인생살이는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다. 남편은 첩을 얻었고 나는 얼떨결에 임신을 했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태동에 놀라 뱃속에 뱀이 들어 앉았나 놀라기도 했다. 산에 가서 물을 마시면 뱀알이 뱃속으로 들어온다는 속설이 떠돌던 때라 내 뱃속에 뱀이 또아리를 틀었나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얼마나 남편과의 정이 없었으면 뱃속에 들어앉은 게 뱀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가여워라. 순례야.
■ 스무 살의 내가 만난 휘몰아치는 파도 위의 절벽
아들 태호를 낳았고 남편의 무자비한 언행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쫓겨나듯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서도 멀쩡한 남자들이 아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데 배운 거 가진 것 없이 살았던 그때는 남자들은 성질대로 살았다. 여자들이 희생당하는 건 군말할 거리도 안됐다. 갓난쟁이를 업고 집을 나오는 길, 스무 살의 내가 만난 휘몰아치는 파도 위의 절벽은 너무 가팔라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파도가 바로 나를 집어 삼킬 듯이 달려들었다.
아들은 비명을 질러대며 울었지만 나는 그 와중에도 허기를 느꼈다. 기진맥진하면서 골내미까지 가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인정이 마르지 않아 동네에서 삶은 시래기국을 한 그릇 얻어먹고 친정에 갔다.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출가외인 이씨집 귀신이 되라며 나는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를 살았던 여자들의 삶이란.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유식한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남편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친정의 환경, 남편의 그늘이 여자들 인생의 전부였다. 친정에서 내몰리고 내 인생은 갈 길을 몰라 헤매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광주리에 물건을 이고 팔러 다니는 여자들이 많았다. 스무 살짜리 내가 뭘 알까 그저 그분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면 우리 새끼 밥은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다시 대전으로 나갔다. 광주리 장사들 따라서 애기업고 물감 들이는 공장으로 따라 나갔다. 염색하는 공장이었는데 밥 얻어먹고 공장일도 하고 식모살이도 같이 했다. 일이 손에 익을 무렵 애기가 있으니 일에 방해된다고 애를 떼어놓고 오란다.
잠깐만 애를 맡기고 돈 벌어서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집에 맡겼는데 남편이 알게 되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 남편 집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서 나는 다시 수원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우연히 다시 염색하는 공장이었다. 그 집에서도 공장에서 일하고 식모살이를 했는데 도둑누명을 쓰는 바람에 공중변소 안에서 한나절을 못나가고 숨어있었다.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변소 하나를 두고 줄서서 썼는데 한나절 동안 냄새가 진동하는 변소 안에 갇혀 있느라 진땀을 뺐다. 천운으로 옥천 경찰서 있는 이가 수원 그 동네 파출소로 발령을 받아서 왔고 조사 받는 과정에 오빠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서 누명을 벗겨주고 빼내주었다. 인생이 절벽으로 내몰리기는 하지만 목숨은 간당간당하게 살려주었다. 그래서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다. 차라리 죽이던지...숨을 꼴딱꼴딱 숨만 쉬게 하고 사람을 담금질 시킨다. 참으로 가혹한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