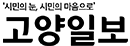최재석 (1933~)
쐐기풀을 잡듯이 인생길을 걸어오신 어르신. 여름에 꽃이 피는 쐐기풀은 줄기나 잎사귀에 연한 가시가 있다. 만지면 당연히 따끔거린다. 살짝 스치거나, 건드리면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지만 특이하게도 오히려 꽉 잡으면 아무렇지 않다. 우리 삶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대담하게 처신하는 것이 선한 결과를 낳는다.
인생 무대에서 주역으로 은퇴한 미남배우를 또 만났다. 최재석 어르신. 들려주시는 말씀 사이사이에 “말하면 뭐혀”를 추임새로 재차 넣으셨다. 근현대사의 주역으로 살아오신 어르신은 구순을 목전에 두고 계신다. 맨주먹으로 험난한 세상의 출발선에 서서 사모님과 하나둘 이뤄 이제 부러울 게 없는 ‘어른’으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 가족이라는 울력으로 절망의 벽에서 희망의 문을 열다
아내도 둘째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나뭇짐을 지었고 완행열차 타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온갖 장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농사라고 할 것도 없는 적은 땅뙈기에 고추나 심고 있을 때 아는 분이 잔디 떼를 팔아보라고 했다. 산소에 입히는 잔디 떼를 팔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장해 나갔다.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여의 살이 시키면서 우리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면 가릴 것이 없었다. 지게에 문짝만 한 나뭇짐 지는 건 나에게 예사로운 일이었다. 다른 장정들보다 몇 배의 짐을 날랐는데도 인생의 무게가 워낙 컸던지 지게에 짊어진 무게는 거뜬했다. 내 인생의 짐으로부터 피신처를 찾지 않았고 항상 정면승부를 했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간간이 운명이란 녀석에게 밀리는 듯이 보였어도 결국은 이겨내고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나는 부락 사람들을 모아서 쌀 계도 조직했다. 계주는 오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때는 쌀 50 가마를 타는 데 계주니까 1번을 타서 쌀 놀이만 잘하면 50 가마를 그냥 얻게 된다. 50 가마는 식구들이 먹고 팔기도 하면서 우리 집에 큰 살림 밑천이 되었다. 계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계주는 인근에서 신용 좋기로 평판이 나야 할 수 있었다. 신용 하나는 자랑할 만해서 난 계주 노릇을 잘했다. 내 신용은 이웃들에게 장예 쌀을 대신 빌려주며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었다. 그 땐 장예 쌀 이라고 해서 서민들이 보리 고개를 넘기 위해서 지주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쌀을 빌리곤 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굽실 거리며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얻어갈 수 있는 장예 쌀이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빌리고 갚는다 해도 쌀을 빌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 설사 장예 쌀을 빌렸다 해도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장예 쌀을 쓰니 가난은 계속 대물림 될 수밖에 없었다. 없는 자의 악순환이었다. 그래서 신용 좋은 내가 조금이라도 적은 이자로 장예 쌀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돼서 그때 이웃을 도왔던 내 발품이 우리 자식들에게 덕으로 켜켜이 쌓였다.
나는 1970년대 이후 담배 농사를 주업으로 했고 자타공이 담배 박사였다. 처음에는 내 이름의 논이 없어서 담배 농사를 궁여지책으로 시작했다. 아내와 둘이 2100평을 농사지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담배 농사로 4형제를 대학까지 다 가르쳤다.
담배 농사도 여간 어려운 농사가 아니지만, 나라에서 전량 수매를 해주는 덕분에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시작하게 되었다. 썩은 것 까지도 수매해주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나라에서 전매를 하는 대신에 한여름 뙤약볕에서 비 오듯이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일해야 한다. ‘담배 농사짓는 집엔 딸 시집 안 보낸다.’ 그런 말이 있듯이 담배 농사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더운 여름에 커다란 담배잎을 하나하나 따서 엮고 건조하는 과정이 옛날엔 전부 수작업이다보니 오죽 힘들면 딸 시집보내지 말라는 말이 나왔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 여느 집처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 일을 군말 없이 도왔다. 우리 아들들이 지게에 한 짐씩 짊어지고 숨을 몰아쉬며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서로 집안일을 도우며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견뎌냈다. 우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 누구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담배 농사할 때도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잘 엮어주고 어린 손들을 부모 일손 돕는다고 제법 보탰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울력으로 내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다.

■ 작은 씨앗 하나가 무성한 숲을 이루다
우리 부부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이루고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아들들 덕분이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충돌하고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어 혹독한 시간을 겪으면서 성장통을 앓는다.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처럼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치명적인 일들이다. 아이들 훈육하느라 진을 빼는 일이 없어 우리 부부는 어렵지만 살림도 빨리 일으킬 수 있었다.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마음고생 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봤다. 다른 집 사내아이들은 성장할 때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다반사이며 밖에서도 골칫거리를 들고 들어오는 게 부지기수였다. 우리 4형제는 손 댈 일이 없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은인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새벽에 일어나 농작물과 눈 마주치는 일이 우리 24시간의 첫 시간표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그 마음 하나였던 어린 시절부터 나는 게으름이라는 말을 몰랐다. 아침 이른 걸음에 텃밭의 아이들을 돌보고 나는 대전으로 출근도장을 찍으러 간다. 친구 서넛이 모여 화투도 치고 콩국수 한 그릇씩 사 먹는 재미가 없었다면 이 노년이 얼마나 적적했을까. 대전 오가는 길은 나의 든든한 애마 오토바이가 길 안내를 한다. 아내는 옆집 제수씨와 우리 텃밭 넘어 사는 90세 된 연심이 어머니와 자매처럼 친구처럼 하루를 보낸다. 60여 년 전 동서로 만나고 50여 년 전 이웃으로 만나서 자매처럼 살고 있다. 세 사람 다 아직 자리보전하고 눕지 않은 덕에 한자리에 모여 수다도 나눌 수 있다. 나이드니 곁을 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인이다.
구순을 바라보는 우리 부부는 아직도 24시간을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던 어린 지게꾼이 아직도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잔다.

4형제는 사회에 나가 보란 듯이 사장 소리 들으면서 내 자랑이 되었다.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찾아오는 우리 며느리들에게 내 지갑을 열어 5만 원 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시아버지 사랑을 드러내도 손이 떨리지 않는다. 쐐기풀을 잡듯이 경계와 용기를 늦추지 않고 걸어온 인생이 무성한 숲이 되었다.
봄에는 예쁜 꽃들의 향연,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가을에는 단풍의 절경, 겨울은 함박눈 꽃으로
바라만 봐도 황홀한 숲을 이뤘다. 아내 그리고 4형제가 울력의 힘으로 같이 일궈낸 숲은
80여 년의 기나긴 그 세월을 덮었고 깊이는 끝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