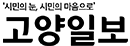최재석 (1933~)
쐐기풀을 잡듯이 인생길을 걸어오신 어르신. 여름에 꽃이 피는 쐐기풀은 줄기나 잎사귀에 연한 가시가 있다. 만지면 당연히 따끔거린다. 살짝 스치거나, 건드리면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지만 특이하게도 오히려 꽉 잡으면 아무렇지 않다. 우리 삶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대담하게 처신하는 것이 선한 결과를 낳는다.
인생 무대에서 주역으로 은퇴한 미남 배우를 또 만났다. 최재석 어르신. 들려주시는 말씀 사이사이에 “말하면 뭐혀”를 추임새로 재차 넣으셨다. 근현대사의 주역으로 살아오신 어르신은 구순을 목전에 두고 계신다. 맨주먹으로 험난한 세상의 출발선에 서서 사모님과 하나둘 이뤄 이제 부러울 게 없는 ‘어른’으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 결핍투성이 유년, 다섯 살짜리 지게꾼
어린 시절의 나는 결핍투성이었다. 기억에서도 사라진 수많은 일을 경험하며 어느덧 여든의 아홉 고개를 넘고 있다. 나는 5남매의 맏이였고 때 거리도 없는 집에서 아버지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선비였고 어머니는 무쇠도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작은 몸으로 살아내고 계셨다. 내 몸집보다 더 큰 지게를 짊어졌던 다섯 살이 내 기억의 처음이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집안일을 거드느라 두 해를 놓치고 3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부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머리가 좋아서 특히 산수에 능했는데 일본 선생도 내 옆댕이(옆자리)앉은 친구들한테 내 답을 보고 베껴 쓰라고 했다. 내심 뿌듯했지만 내 작은 기쁨도 거기까지였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애 늙은이였던 나는 학교 대신에 식장산에 올라 나뭇짐을 지기로 작정했다. 마을에서 돈 좀 있는 집 아들이었으면 최씨네 누구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을 텐데 집이 가난하니 나의 재능도 소리 없이 묻혔다. 당시 공부는 나에게 그저 사치였다.

어머니를 돕겠다고 동네 동갑 친구들 여덟 명과 같이 나무를 하러 다녔다. 지금은 다 고인이 된 친구들이지만 마을에서는 이미 벌목을 다 해버린 뒤라 나무를 하려면 식장산을 넘어 대전까지 다녀왔다. 새벽 4시, 칠흑처럼 어두운 그 시간에 출발해서 깜깜한 밤중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지게꾼들인 어른들과 보폭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한창 먹을 나이에 배를 곯아가면서 나무를 해오는 길도 여간 서글픈 게 아니었다. 너무 늦으면 지게를 지고 뜀박질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 순간은 나무 짐이 주는 무게가 아닌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로 어깻죽지가 떨어져 나갈 듯이 고통스럽기도 했다.
나무하러 다닐 때는 밥때를 다 챙겨 먹을 수 없어서 배가 고플 땐 호주머니에 넣어둔 고구마를 꺼낸다. 고구마 두 개를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이 후다닥 먹고 손바닥으로 계곡물을 떠서 마시고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밥은 어디에도 없다. 급히 먹는 바람에 가끔씩 물기 없는 고구마에 목이 메었다. 숨쉬기 곤란한 경우도 허다했다. 다른 삶의 방정식을 만들 수 없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냈다. 그리고 최선이었다.
■ 결혼 후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올가미
고단하고 암울한 청년기를 보내면서 22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성실하고 인물 좋다는 소리를 제법 들어서 간간이 중신애비들이 아버님을 찾아와 혼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무렵 아내의 친척분이 중신을 서게 되셨다. 새댁이 들어와서 살만한 여건도 마련하지 못한 곤궁한 살림살이였다. 아내는 1934년생 이연순. 아내는 자상한 부모님 슬하에서 사랑받고 자란 순박하고 참한 여자였다. 결혼 당시의 내 환경의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누님 집에 얹혀살고 있었으며 새댁을 맞을 수도 없는 방 두 칸짜리 집에서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어른들 주선으로 중신애비가 다리를 잘 놓았다.

중신애비가 “살림이 어려워도 신랑감은 반듯하다. 신랑감 하나 보고 시집가라 ”고 다독이며,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모양이다. 사실 그 말은 허언은 아니다. 아내에게 속이려고 작정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 후에 아내에게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닌 누님 집이었다고 실토를 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지만 아내는 곧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괜찮아요, 우리가 벌어서 집 지으면 되죠.”
넓은 아량으로 내 자존심을 지켜준 아내는 사는 내내 나의 천군만마였다.
결혼 후 3년 뒤, 우리 집 살림의 현주소는 큰 아들 영진이가 갓난쟁이였고 남동생이 결혼하면서 제수씨를 새 식구로 맞이했다. 제수씨는 지금 우리와 아래윗집 살면서 아내와는 피를 나눈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아내는 나와 같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며 밖에서 돈 버느라 종종걸음 쳤고 제수씨는 아버님 병구완에 집안 살림하면서 고단한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만나 한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도 운명이다. 우린 다들 운명에 순종했고 서로 품을 팔고 마음을 내어주면서 진짜 형제가 되었다.

아버지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시장에 나가셔서 빚 얻어서 술을 드시곤 했다. 술은 아버님이 드시고 외상이 쌓이면 결국 내 몫이었다. 외상이 몇 번 쌓이면 쌀 한가마 값을 물어주었다. 사나이 자존심은 빚내서 술을 마시느니 차라리 술을 끊는 게 마땅한 처신이지만 아버님은 그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채 살 수밖에 없으셨다. 안타까운 분이었다. 아버님 초상 후에도 나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하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개중에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 한 채 나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일이 정황을 따지며 물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평소 아버지의 처신을 보자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서 난 군말 없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를 그나마 초라하지 않게 보내드리는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그런 짐을 대물림하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나를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처신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