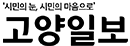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고양일보] 목사님, 정말 오랫만에 안부를 전합니다. 글을 안 쓴지 벌써 한 달 이상이 되어 무척 궁금하셨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힘을 내어 이렇게 안부 글로서라도 소식을 전해야 할 것같아...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음을 용서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글 벗으로 제 곁에 머무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겠지만 저 역시 그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기력함의 무게에 짓눌려 어려웠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 앞의 뚝방길을 한 시간씩 걷는 일과 제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從의 일기'를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 일상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포노 사피엔스 (phono sapiens) 등의 신종 유행어를 따라가기도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목사님께 우울한 이야기로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저는 글쓰기만이 아니라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 소리를 듣게 되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격언을 따르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저 자신이 자꾸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 뒤떨어져 한물간 꼰대라는 소리도 듣기 싫은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변화도 없고 이에 도전도 없기에 쓸 이야기거리도 없어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뻔한 일상의 이야기만을 되풀이하는 것도 지루하며 권태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겨우니까요.
스마트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젊은 부부들이 그 고가의 물건을 어린 자녀들에게 통째로 주어 장난감 대용으로 사용케 하는 것을 호통치며 금하게 했는데, 이젠 형편만 되면 아이들에게도 한 대씩 사주는 시대가 되어 저는 그야말로 시대를 읽지 못하는 뒷방 노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점점 거짓말로 아이들 기만 죽이는 못된 영감이 되어가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 현실인 걸요...
예전엔 어린아이들을 연예 무대에 세워 성인 가요들을 부르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어린이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었는데, 지금은 청학동 훈장님부터 어린 막내딸 트롯트 시합 공연무대 뒤에서 눈을 반짝거리며 열심히 응원하는 것을 보면 무늬(옷)만 청학동이지 마음은 명동이란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반대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대학시절 서울 명동에 살았던 내가 지금은 누런 논바닥을 곁에 끼고 있는 일산 끝자락의 뚝방길 동네에 살고 있으니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 어린 것들이 연예무대에 일찍 데뷰하여 청순한 소녀 학창 세월을 넘겨버린 문주란 등의 여가수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었는데, 지금은 시각을 달리하여 부러운 시선으로 보게 된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최근 저는 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 현실종교인데, 미래 학자들은 역사학적 관점에서나 사회과학 관점에서 모두 뇌과학을 기본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뇌과학이 대세인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신앙의 설 자리를 생각해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원인이 뇌의 영향력 안에 있고 인간은 뇌의 막강한 지배에 의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떠드는 시대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에 따른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법정에 세워짐 없이 곧바로 시체처리장으로 밀어넣는 뇌과학의 세계에서는 신이 설 자리가 없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은 차가운 인조 기계인간 안드로이드(android)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고, 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길 잃은 표류선처럼 미로의 안개 바다 위를 정처없이 떠도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판데믹(pandemic)의 고통 속에서도 인류의 염원인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대신 계속하여 서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면서도 정작 구원의 메시야가 나타났을 때엔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일까요? 왜, 왜, 왜?
나는 저들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치 못하고 입을 닫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믿음 없는 저들의 의심의 안개와 걱정의 구름을 걷히게 할 수 없고, 저들이 두려워 하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을 해소시킬 답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풀 수 없는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 속에서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는 공허한 인간의 이성 사이를 헤집고 새어 나오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뇌과학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신념으로도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또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명료함입니다. 영은 우리의 제한된 육체에 갇히지 않고 우리 육체 안에 있되 육체(뇌)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데카르트(Descartes) 명제가 뇌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주체의 존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존재(뇌) 없이 생각만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유령의 망상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invisible God)의 존재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은 과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을만한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과학이 더 오만해지기 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의 존재성을 확실히 드러내 말해 줄 때가 되었습니다. 큰소리로 외치되 시대를 가르는 예언을 던져야 합니다. 과학은 과거 역사의 증명에 의존할 뿐 미래 예측의 변화를 예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예언하는 일 말입니다.
새벽 안개 속에 묻힌 교회의 십자가 첨탑이 보일 듯 말 듯 시야에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존재를 드러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숨어버린 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 무엇 하나 확실히 잡히는 것 없이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 위에 못박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절규와 함께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둘 때에도 그분은 아들보다 더한 찢어지는 아픔을 삼키며 침묵으로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으니까요. 항상 아버지 같고 큰형님 같이 다정한 그래서 더욱 존경하는 목사님의 평강(平康, peace)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