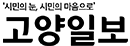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전 청와대 외교보좌관실 행정관)
2002년 덴마크 코펜하겐. 9월의 날씨임에도 차가운 습기가 거리를 쓸고 지나가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기엔 너무나 쌀쌀해진 거리에는 덴마크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ASEM 4. 이른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유럽연합 27개국과 아시아 16개국의 정상내외 그리고 장관급 공식 수행단이 참석하는 초대형 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코펜하겐 사람들과 거리는 긴장된 모습이었다.

이희호 여사도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 나날들을 분주한 외교일정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크론버그성(Kronberg Castle)에서 열리는 덴마크 여왕 주최 공식만찬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랬다. 그러나 외교는 항상 예측불가능의 위기로 충만한 낭만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번 만찬도 예외는 아니었다.
덴마크 외교부 의전관의 안내에 따라 이희호 여사와 통역관인 나는 만찬장 지정석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곧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원형 테이블마다 각국 정상내외가 착석하기 시작했고, 주최 측의 의전 결정에 따라 각 나라의 정상 내외분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로 분산 배치될 계획이었다.
우리는 사전에 통고받은 대로 국가명과 이희호 여사 존함이 쓰인 지정석 앞으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나라 정상이 편안히 착석하여 환담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희호 여사는 외교무대의 베테랑답게 미소를 잃지 않고 덴마크 의전관의 판단을 우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색이 된 금발머리 의전관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붉게 상기되어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기 시작했다.
외교에서도 이런 걸 대형사고로 부른다. 의전은 잘 해야 본전이라는 조크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낭만은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희호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황하는 의전관을 질책하거나 어찌해야 하는지 곤란한 질문을 던지며 곤란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여사는 테이블에 착석한 인사 가운데 잘 아는 한 사람을 발견하곤 친절히 눈인사를 하며 외교적 대화를 시작했다. 상대는 바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었다.

눈치가 9단인 시라크도 대략 눈앞의 상황이 의전상의 위기임을 직감했으리라. 이희호 여사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라크 대통령과 대화를 편안하게 주고받고 있었다.
한 사람은 서서, 또 한사람은 앉아서. 하지만 프랑스 남자들은 신사라고 하지 않던가.
당연히 시라크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 옆으로 다가서서 잠시 대화를 하고는 여사의 손을 점잖게 잡고 나란히 팔짱을 끼는 대담함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신사가 숙녀에게 자리를 안내하듯, 만찬장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두 사람의 친분을 과시하듯, 상냥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이희호 여사를 빈자리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만찬장을 가로질러 마치 춤추듯 두 사람의 모습은 사뿐사뿐, 천천히,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할리우드 영화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책임자를 문책하며 자신의 당혹감을 모면하는 식의 촌스럽고 교양 없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솔루션이었겠으나, 두 사람의 연륜은 외교 이상이었다.
모든 혼란과 착오를 두 사람의 낭만적인 행동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며 갈채 받았던 것이다.
만찬장의 모든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와 안도의 한숨과,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줄 아는 대가들에 대한 존경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낭만.
자신의 불편함을 탓하며 주위사람을 질책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 한 줌의 낭만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유.
우주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권력에 도취된 리더라면, 예측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할 때 긴장하고 흥분하며 주위를 탓하기 마련하다. 단 한 순간의 여유도 나누기 어렵다.
자격.
상대를 배려하면서, 함께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적인 해법과 품격을 보일 수 있는 리더의 모습. 그 것이 바로 국격이며 유권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인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코펜하겐의 달밤은 저물고 있었다.